[단편소설] 힘내라는 개소리 - 상

오랜만에 단편 소설을 올립니다. 상, 하 2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편이 끝입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오늘도 그녀가 없었다. 벌써 열흘이 넘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녀에게. 아니면, 그녀의 아들에게.
그는 겨드랑이를 받치고 있던 목발을 가지런히 모은 뒤 쉼터에 하나 남은 멀쩡한 벤치에 털썩 주저 앉았다. 비어있는 옆자리에 목발을 기대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두 손으로 목발을 자기 앞에 세워 움켜쥐었다. 살랑 바람이 불어와 이마의 땀을 식혀 주었다. 날은 서늘해졌는데도 목발을 짚으며 낑낑대고 걷고 나면 늘 땀이 났다.
지방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던 그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3년 전이었다. 2번에 걸친 수술과 긴 재활기간을 거쳐 한 쪽 다리는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두 다리가 다 나은 게 아니라면 부질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도 나갈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하던 그였지만 이제 다시는 두 발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 다리를 생각할 때마다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는 없었다. 그렇다고 장애인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다. 하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잠만 잤다. 그 시간에 거기로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집에 두고온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두 다리가 다 나았다면 어땠을까. 결론도 나지 않을 생각을 하고 또 하며 그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감옥 속에 밀어 넣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그를 의사에게 끌고가다시피 했고, 의사는 당장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근육이 더 손실돼서 움직이기 힘들거라고 겁을 줬다. 아버지는 그의 손에 목발을 쥐어주셨고, 그는 걷는 법부터 다시 연습했다. 처음엔 한 걸음 옮기기만 해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위태했다. 몇 걸음이라도 걸을라치면 이내 겨드랑이와 손바닥이 욱신거렸고, 어찌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지 온몸이 다 아파왔다.
가급적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곧 동네 뒤쪽의 한적한 뒤안길로 연습을 나갔다. 걷는 연습을 하며 매일 조금씩 다니는 거리를 늘려 나가던 어느 날 그는 수풀 속에 방치돼 있던 좁은 공터를 발견하게 됐다. 아마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마련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잡초가 무릎 높이로 우거져 있었고, 테이블이며 벤치들도 망가져 있었다.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 건너에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는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흉물로 자리한 폐건물이 된 지 오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서 그녀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가 온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가 오든 안 오든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오른손으로 두 목발을 한 손에 그러쥔 그는 왼손으로 그녀가 늘 앉던 자신의 옆자리를 쓰다듬었다.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고개를 쑥 빼고 그녀가 늘 걸어오던 아랫동네 쪽 길을 바라봤다. 지금이라도 풀을 헤치며 그녀가 걸어올 것만 같았다. 두 달 전 그날처럼.
집에서 이곳까지 걷는 연습을 마치면 으레 쉼터의 벤치에 앉아서 숨을 돌리곤 했다. 아픈 겨드랑이와 손도 좀 쉬게 해주고, 다리가 부러져 고꾸라져 있는 테이블을 보면서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도긴개긴이구나, 하며 자학 모드에 빠지기도 했다.
원래는 늘 아침에 산책을 나왔었는데 그날은 어쩌다 보니 오전이 다 지나가서, 아예 느지막하게 길을 나섰었다. 벤치에 앉아 하릴없이 하늘의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풀이 밟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불량 청소년들도 이 망가진 쉼터에는 오지 않았다. 가뜩이나 한갓진 곳인데다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앉아 있을 벤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녀도 이곳에서 사람을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았다. 벤치에 앉아 있는 그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이내 방향을 돌려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 다음날도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걸음을 돌렸다. 세 번째로 얼굴을 마주한 날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기요. 여기 앉으세요. 저 지금 가려던 참이에요.”
말을 마치며 옆에 놔두었던 목발을 집어들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계셔도 돼요.”
그녀는 오늘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터덜터덜 걸어와서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곤 아무말 없이 먼 하늘만 응시했다. 화장을 하고 꾸민다면 한창 예쁠 나이인 20대 초반 정도 돼보였다. 하지만 그날에도, 그 이후로도, 그녀가 화장한 얼굴은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푸석한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있었고, 더운 날씨인데도 항상 긴 소매의 티셔츠를 우중충하게 입고 다녔다. 꾹 다문 입술과 무표정한 얼굴은 내면의 슬픔과 분노가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철벽의 둑 같았다. 내 표정도 저럴까. 혹여 자신의 둑에도 금이 갈까 그는 먼데를 바라봤다.
하는 일도 없는 그가 산책을 하는 시간이야 아무 때고 상관없었지만, 그녀를 만난 후로는 늘 늦은 오후나 저녁 나절에 집을 나섰다. 20대의 얼굴을 하고, 40대의 옷을 입은 채 60대의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를 만난다 해도 이곳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딱히 없었다. 그가 먼저 올 때도 있었고 그녀가 먼저 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저 하나 남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몇 시간이고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파트 너머 아랫동네로, 그는 윗동네로.
둘이 말문을 트게 된 건 닷새는 족히 지난 뒤였다. 목발을 짚으며 쉼터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다. 마른 체격의 앳된 얼굴을 한 그녀는 그날따라 더 힘이 없어 보였다. 헐렁한 긴 소매의 티셔츠는 사람이 입은 게 아니라 마른 허수아비에 걸쳐진 듯 보였고, 초점 없는 퀭한 두 눈은 심연으로 이어지는 구멍 같았다. 두 팔과 다리를 재게 놀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녀의 옆 자리로 향했다. 그가 오길 기다렸는지 미처 목발을 벤치 옆에 기대어 놓기도 전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사는 게 왜 이럴까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흐른 땀만 닦아냈다. 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지 그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나보고 힘내래요. 하, 힘내라니. 여기에서 어떻게 더 힘을 내요? 무슨 힘을 더 내요? 먹고 죽을 힘도 없는데.”
말은 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가닿지 않는 먼 어느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차사고가 난 직후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힘내라고 씨불이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다리를 절단하니 마니 하던 상황이었는데 힘내라는 헛소리를 지껄이던 사람들. 그는 아직 제 몸에 붙어는 있지만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왼쪽 다리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며 쓰다듬었다.
“그거 다 개소리에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는지 그녀가 그를 돌아봤다.
“힘내라는 말이요. 그딴 거 다 개소리에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개소리를…”
아무말 없이 땅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맞네요, 개소리. 다 개소리에요."
여전히 땅을 보고 있던 그녀가 말했다. "또 뭐가 개소린지 알아요?”
뭐냐고 묻는 대신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라는 말. 그것도 다 개소리에요.”
그녀는 무의식중에 오른손으로 왼팔을 쓰다듬었다. 팔꿈치를 타고 내려오던 손이 손목께에 오래 머물렀다.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가 더워 보였다.
“지들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죽지는 말래요. 씨발.”
개미 한 마리가 그의 왼쪽 신발을 타고 올라오다가 이내 여기엔 먹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다시 방향을 바꿔 땅으로 내려갔다.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난, 겁쟁이라서 죽지도 못했어요.”
“술 마시면 돼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술 마시면 용기가 생겨요?”
“아뇨. 여전히 겁나죠. 근데 겁나는 걸 잊어버려요. 취해서.”
그는 그녀가 오른손으로 왼손 소매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얼마간 정적이 흘렀을까. 그녀는 갑자기 폐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숨을 토해내더니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손가락 사이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빠져나왔다.
“우리 아들… 깨어날 순 있을까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어려보이기만 한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나 보다. 깨어나지 못하는 아들. 오늘따라 고개를 파묻고 있는 그녀가 더욱 작아 보였다. 앙상한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침묵이 그를 짓눌렀다. 뭐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깨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둔 엄마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는가. 그래도 그녀에게 자신이 마음 아파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뭐라도 말을 해야 했다. 그녀가 먼저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그녀가 더 슬퍼할 것 같았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힘내세요.”
말을 꺼내놓고 그는 아차 싶었다. 이 상황에서 힘내라니, 자신의 방정맞은 혀를 깨물어 버리고 싶었다. 변명을 하자면, 자기가 힘들 때는 힘내라는 말이 때려죽이고 싶도록 싫었는데 막상 위로를 해줄 상황이 되자 그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이 안 떠올랐다. 더구나 지금 그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다.
“그거 다 개소리라면서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어이없다는 듯 빨갛게 충혈된 눈을 흘겼다.
진땀이 났다. 자신의 진심이 한순간에 개소리로 전락해버릴 위기였다.
“개소리…긴 한데, 그게 좋은 개소리에요. 그러니까 개소리가 진심인 건데...”
그는 말을 하는 자신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만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개소리가 진심이라니, 이거야 말로 무슨 개소리냐. 그는 더욱 다급해졌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이 개소리긴 한데, 이제, 저는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힘내라거나 죽지 말라는 말. 개소리긴 하지만 그게 좋은 개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개소리... 멍멍멍! 멍멍멍!”
말은 할수록 꼬였고, 그의 진심은 설명할수록 자꾸 개소리가 되어갔다. 그는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냥 개 짖는 소리를 흉내냈다. 그가 되는 대로 주워 담다가 급기야 개 짖는 소리까지 내자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녀도 피식 웃어버렸다. 그의 말도 안되는 궤변이 어처구니 없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용쓰는 그가 안쓰러웠는지, 그것도 아니면 혹시라도 그의 개소리가 진짜로 위로가 된건지 그건 모르겠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그녀의 입가에 아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소가 어려있다는 거였다.
틈이 생기자 옳다구나 싶어서 그는 핏대를 세워가며 개 짖는 소리를 냈다.
“멍멍멍! 멍멍멍! 아우우우~! 아, 이건 늑대구나. 멍멍멍! 멍멍멍!”
그의 능청스런 모습에 그녀는 다시 푸핫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를 만난 후 처음으로 스무살에 걸맞은 웃음을 본 그는 때로는 개소리도 웃음을 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며 계속 짖어댔다.
(다음 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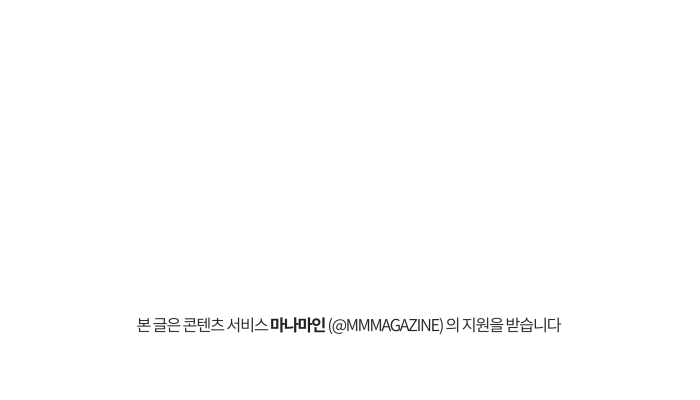
Congratulations @bree1042! You have completed the following achievement on the Steem blockchain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Click here to view your Board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하편도 기다리게되네요.
한 두어군데에서 몇개 떠오르는게 있네요.
"씨불이던" 에서 잠깐 '불이'님 아이디가.. ㅎㅎ
그리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개소리에서 늑대소리로 변해가는것도 나름 상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씨불이던.. ㅋㅋㅋ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ㅎㅎㅎ
20대의 얼굴에 40대의 옷을 60대의 표정을 갖고 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설을 쓰면 각 등장인물의 인생을 떠올려보게 돼요. 소설 안에 다 묘사하진 않더라도 저는 그들의 인생과 앞뒤 사연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놓거든요. 그녀는, 참 힘든 생을 살았네요...
하편이 기대되요! +_+!!!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 또한 그게 도움이 안되는 걸 알면서도 뻔하게 힘내..괜찮아.. 밖엔 할 말이 없더라는. 그럴 때 저도 써먹어볼까봐요; 개소리 멍멍멍;;;(그 후로 저를 안 만나주려나요? ㅋㅋㅋ)
저도 너무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다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정말 진심이라는 걸 상대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죠.
좋은 개소리도 자꾸 듣다보면 세뇌되서... 위로가 되는거 같아요.
10대의 얼굴을 하고, 20대의 옷을 입은 채 60대의 표정을 짓고 있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아, 상상이 안 가네요. 뽀돌님이 60대의 표정을 짓고 다니셨다는 시절이...
멍멍멍!
다음 편 나오면 같이 볼게욧!!!!
대세는 시리즈 정주행이죠.ㅎ
꼭 올려주셔야하옵니다~~
지금 마지막편 올렸습니다. ^^
큰 줄기는 한 달 전쯤에 다 써놨는데 마지막 교정을 보며 자꾸 고치느라 붙잡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
개소리인걸 알면서도 그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기가 힘드네요^^;
맞아요. 힘든 사람에겐 힘내라는 말밖에 더 해줄 말이..
힘내라는 말에 대한 재정의,ㅎ
다들 늘 생각없이 쓰는 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볼만한 말인 거 같아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바로 올라갑니다^^